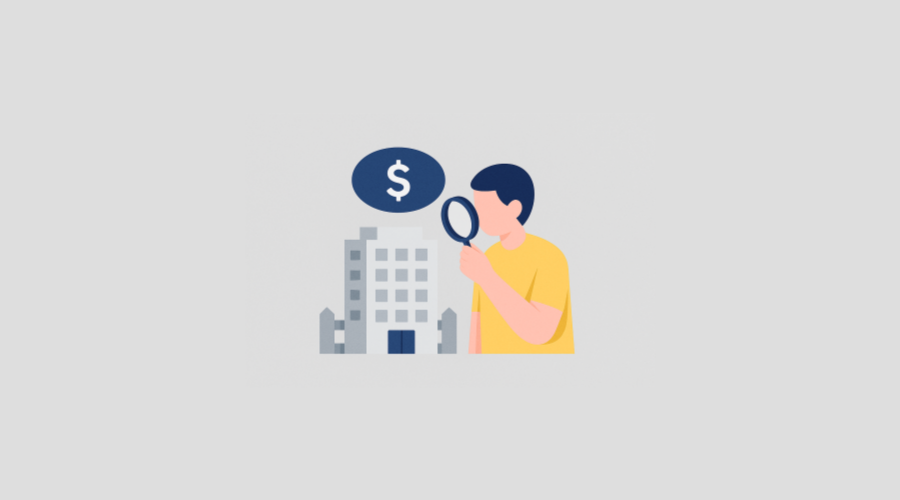전세 인테리어 공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원상회복 의무 범위
전셋집도 2년 이상 살 내 집인데, 낡은 벽지나 촌스러운 조명을 내 취향에 맞게 바꾸고 싶은 마음,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
큰돈이 드는 전세보증금을 내고 장기간 거주하는 만큼, 공간을 더 아늑하고 예쁘게 꾸미고 싶은 것은 당연한 마음이죠.
하지만 무작정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다가는, 계약 만기 시 집주인으로부터 ‘원상복구’라는 예상치 못한 요구와 함께 수리비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으로서 어디까지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지, 분쟁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알아둬야 하는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임차인의 기본 의무, 원상회복 의무란
전세 인테리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법률 용어는 바로 ‘원상회복 의무’입니다.
우리 민법 제615조는 임차인이 빌린 물건을 원래의 상태 그대로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즉,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고 집을 비워줄 때, 처음 입주했던 상태 그대로 집을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조항 때문에 임차인이 마음대로 집의 구조를 바꾸거나 큰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말하는 원상회복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햇빛에 의해 벽지가 바래거나, 일상적인 걸음으로 인해 생긴 마루의 미세한 흠집 등은 임차인이 일부러 훼손한 것이 아닌 ‘통상의 손모(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손상)’로 보아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입장입니다.
전세세입자,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인테리어일까요? 🤔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인테리어가 허용되고, 어떤 것은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원상회복이 얼마나 쉬운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쉽습니다.
동의가 필요 없는 ‘일상적인 사용’ 범위 건물의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고, 퇴거 시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들입니다. 압정이나 핀으로 달력이나 가벼운 액자를 거는 행위, 기존에 있던 못이나 커튼봉을 활용하는 행위, 가구를 배치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반드시 동의가 필요한 ‘설치 및 변경’ 행위 주택의 상태를 변경하거나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위는 사전에 반드시 집주인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벽걸이 TV나 에어컨 설치를 위해 벽에 구멍을 뚫는 행위, 페인트칠이나 도배를 새로 하는 행위, 조명이나 도어락을 교체하는 행위, 중문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모두 해당합니다.
비용과 분쟁을 해결하는 열쇠, 계약서 특약
만약 집주인 동의를 받고 공사를 했다면, 그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필요비’와 ‘유익비’라는 개념이 등장하며 분쟁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민법 제626조에 따르면, 보일러 수리처럼 반드시 필요한 ‘필요비’는 임차인이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고, 창호 교체처럼 집의 가치를 높인 ‘유익비’는 계약 종료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임대인이 유익비 상환 대신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비용 분쟁과 원상회복 의무 다툼을 한 번에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구두 합의’는 나중에 입증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반드시 계약서에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추천 특약 예시: “임차인은 [벽지 도배, 조명 교체 등 구체적인 공사 내용]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 만기 시 원상회복 의무를 지지 않는다. 단, 해당 공사에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이처럼 공사 범위와 원상회복 의무 면제, 그리고 비용 청구권 포기 등을 명확히 교환하는 방식으로 합의해두면, 양측 모두 분쟁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분쟁 이전에, 내가 들어갈 집 자체에 수리할 곳은 없는지, 계약 조건은 나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계약 전 주택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나에게 유리한 특약까지 챙기는 과정이야말로 내 보증금을 지키는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